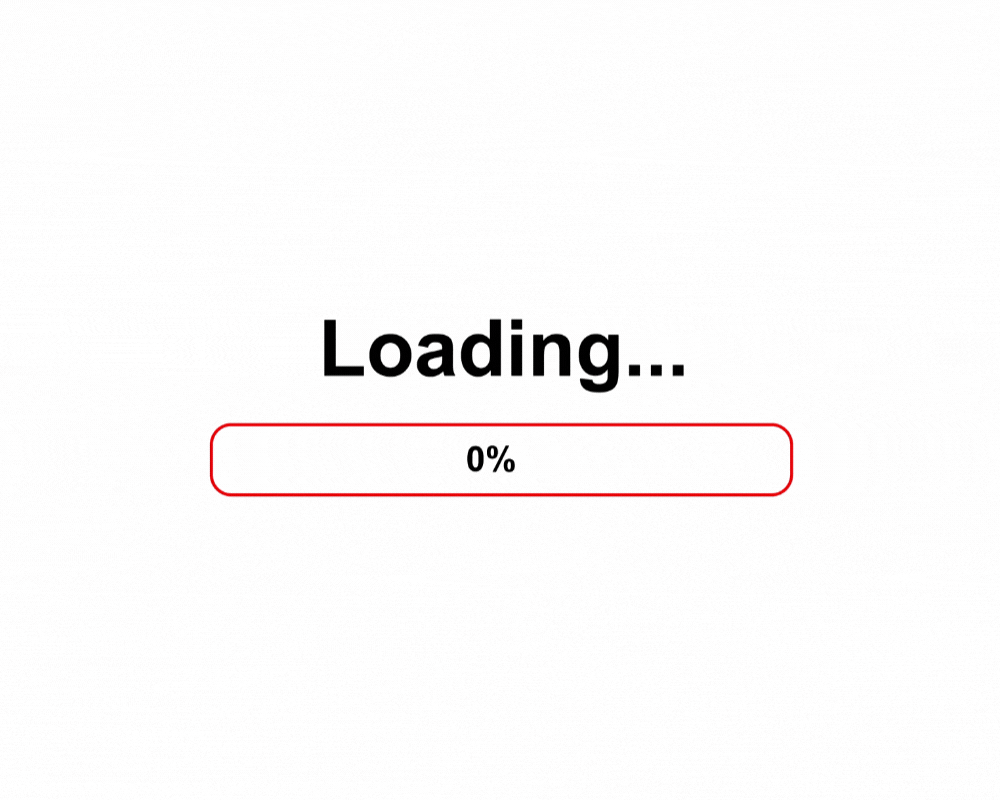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인간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문제는 거짓말의 규모와 빈도이다. '공상허언증'은 거짓말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누군가에게 질문에 둘러대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패턴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해서 늘어놓는다. 양심의 가책, 다른 사람의 의심,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보다는 그럴싸한 거짓말을 늘어놓아 자산이 추구하는 자기상을 확고히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관심받고 싶은 마음으로 인한 거짓말
공상허언증이란 심리적 장애중 하나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장 혹은 왜곡해서 말하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1891년 안톤 델브뤼크에 의해 의료 문헌에 처음으로 소개된 공상허언증은 거짓말과 망상의 중간 정도 경계에 있는 정신병리학적 증후군이다. 특히 타인의 사랑이나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흔히 인터넷상에서 접하는 관종(관심 종자'의 줄임말로 SNS 팔로워와 좋아요 숫자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상태를 의미) 또한 큰 범주 안의 허언증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관종의 경우 스스로 거짓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타인의 주목을 끌기 위해 하는 인식적 거짓말이기 때문에 허구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으며 치밀하게 구조를 짜는 공상허언증과는 구분이 된다.
망상을 진실로 믿는 공상허언증의 진행 과정
-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관심을 받기 위해 자기자신을 그대로의 모습보다 더 근사하게 포장한다.
- 포장을 위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보태며, 그 과정에서 점차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착각하는 단계에 이른다.
- 자신의 이러 말과 행동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점차 거짓말의 강도를 높인다.
- 자신이 만든 거짓의 세계를 사실이라고 믿으며 심한 경우 정신질환 및 사기범되로 이어진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공상어언증에서 벗어나는 방법
-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기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는 버릇을 의식적으로 고려하며,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다. - 타인과의 삶 관찰보다 내면에 집중하기
SNS에 올라온 타인의 행복한 삶의 모습을 관찰하기보단, 스스로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 어떨 때 편안함을 느끼는지 찾아 기록한다. -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하기
공상허언증의 경우 스스로 극복하기는 매우 어렵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공유하거나 심리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반응형